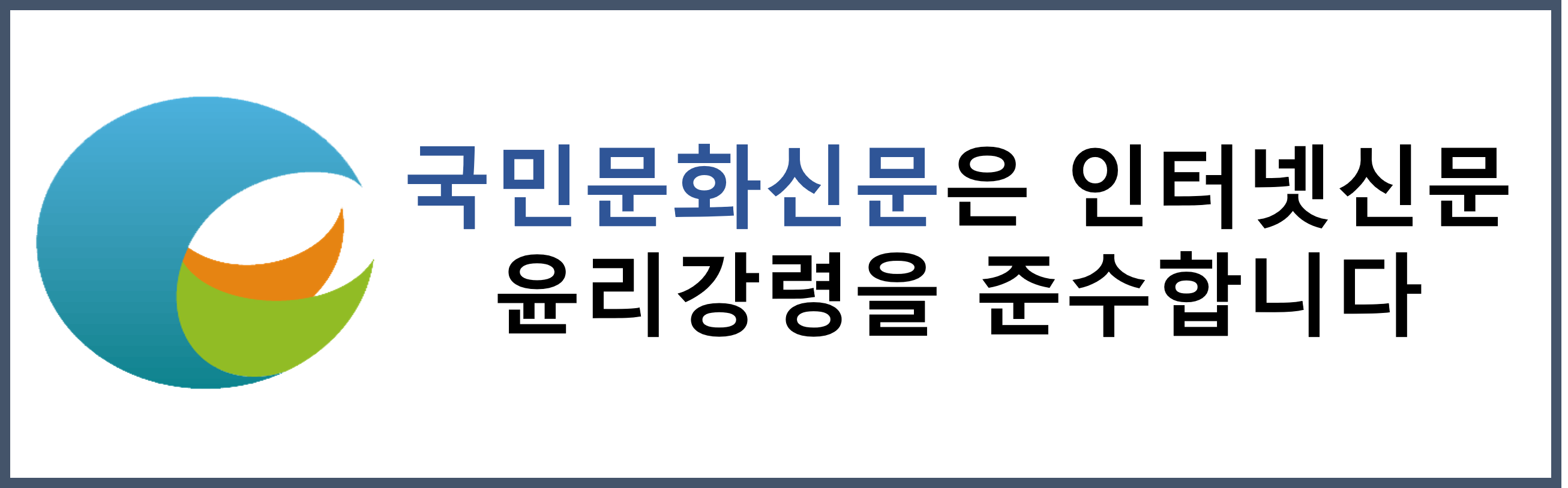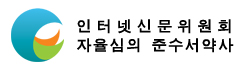시인·묵객이 드나들던 풍류문화의 산실
(강릉=연합뉴스) 이창호 기자 = 강릉시 운정동에 있는 선교장은 300여 년 동안 그 원형이 잘 보전된 한국 최고의 전통가옥이다.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11대손인 무경 이내번(1692∼1781)은 어머니 안동 권씨와 함께 충주에서 강릉으로 이주했다.
 |
집터를 찾던 안동 권씨와 이내번 모자는 족제비 무리를 쫓아가다 명당 터를 발견했고, 1703년 처음 안채인 주옥을 시작으로 활래정, 동별당, 서별당, 연지당, 열화당, 중사랑채 등 무려 10대에 걸쳐 증축을 거듭해 지금에 이르렀다.
선교장은 경포호수가 집 앞까지 이어져 배로 다리를 놓아 건넜다고 해 ‘배다리마을’ 또는 ‘배다리집’으로도 불린다. 이름을 풀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다녔다 하여 선교(船橋)이고, 식량과 물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다 하여 장(莊)이다.
 |
지금 경포호의 둘레는 4㎞에 불과하지만 예전에는 12㎞에 달할 정도로 드넓은 호수였다고 한다. 심명숙 문화해설가는 “선교장은 조선 시대 사대부가의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 가옥의 백미”라며 “선교장 바로 옆에 경포호수와 경포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수많은 시인, 묵객이 선교장을 찾았다”고 말한다.
조선 후기 전형적인 사대부 저택인 선교장에 들어서면 맨 먼저 활래정(活來亭)과 사방연지(四方蓮池)가 반긴다. 연못을 끼고 오른쪽으로 걸으면 월하문(月下門)에 이른다.
너비가 2m 남짓한 작은 문 기둥에 ‘조숙지변수’(鳥宿池邊樹 : 새는 연못가 나무에 잠들고), ‘승고월하문’(僧鼓月下門 : 스님은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린다)이란 시가 걸려 있다.
심명숙 문화해설가는 “이 주련(기둥에 써 붙이는 글씨)은 하루 묵고 갈 거처를 찾는 나그네는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리고 쉬었다 가라는 뜻”이라며 “문 크기도 규모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나그네가 저택을 보고 발길을 돌릴까봐 일부러 대문을 작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
집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을 생각하며 월하문을 통과하면 시인, 묵객이 남긴 여러 글씨와 함께 활래정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처마 곳곳에 다양한 ‘활래정’ 편액이 6개나 걸려 있다. 1816년 지어진 활래정은 정자 건물의 반이 연못에 뿌리박은 돌기둥 위에 세워져 있고, 물 위에 떠있는 누마루와 온돌방, 다실로 구성돼 있다.
연못 내 작은 섬과 마당을 이어주는 목교(木橋)는 6·25전쟁 직후 망가져 철거된 후 지난 2011년 복원됐다. 벽이 없는 활래정은 문을 모두 열면 정자에 앉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수려한 경치를 즐길 수 있다.
‘활래’는 서쪽 태장봉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이 연못을 거쳐 경포호수로 빠져나간다는 의미이다. 이곳에서는 시 한 수가 저절로 나올듯 바라보는 풍광이 빼어나다.
 <선교장의 특이한 문>/이진욱 기자
<선교장의 특이한 문>/이진욱 기자네모난 연못은 천원지방(天圓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을 믿었던 당시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한국 민가정원 정자의 극치를 이루는 활래정을 지나면 소나무 숲 아래 고색창연한 건물과 담, 대문들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안내하는 듯하다.
선교장의 본채 건물들은 담장과 대문 1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물 전면의 행랑채에는 문이 2개 있다. 신선이 기거하는 그윽한 집이라는 ‘선교유거’(仙嶠幽居)란 현판이 걸려 있는 솟을대문은 남자만 드나드는 곳이다. 여자와 하인이 드나들 수 있는 평대문에는 내외벽이 있어 안채와 밖이 구분된다.
솟을대문에서 오른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평대문 내외벽과 안채(主屋), 동별당(東別堂)이 있다. 선교장 최초로 지어진 안채는 종부(안방마님) 거처이며, 집의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소박한 건물이다. 안채는 전면 다섯 칸, 측면 두 칸의 ㄷ자 형태로 대청 양쪽에 온돌방과 고방이 있다.
세간을 보관하던 고방은 여름철이면 평상을 놓고, 그 위에서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자들의 은밀한 공간이기도 하다. 안채의 오른편에 동별당, 왼편에는 서별당(西別堂)이 이어져 있다.
동별당은 집안의 여자들과 여자 손님이 거처하던 곳으로 방과 마루의 모든 벽체가 문으로 되어 있어서 활달하고 개방적인 선교장 가족의 성품과 면모를 보여준다. 동별당에는 ‘오은고택’(鰲隱古宅) 현판이 걸려 있는데 오은은 이내번의 손자 이후(李后)의 호이다. 동북쪽 산 중턱에는 선조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다.
남자들의 서재로 사용되었던 서별당은 안채와 담으로 구분되어 있고, 중간에 작은 문 하나가 나 있다. 담장은 고개를 내밀어 소통하기에 충분하도록 야트막하다. 서별당 아래의 연지당(蓮池棠)은 집안의 홀로된 여인들이 안채의 살림을 도와가며 지내던 곳이다. 앞마당은 ‘받재마당’이라 하여 안채로 반입되는 재물을 확인하는 장소였다. 현재 서별당과 연지당은 한옥스테이 장소로 사용된다.
솟을대문을 지나 왼편으로 들어서면 선교장의 중심인 열화당(悅話堂)을 만난다. 팔작지붕에 홑처마 구조인 열화당은 바깥주인이 기거하는 사랑채로, ‘일가친척이 이곳에서 정담과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 1815년 완공된 열화당의 특징은 툇마루 앞에 설치된 동판 구조물인 차양으로, 한말에 선교장에 머물렀던 러시아 공사관 사람들이 보답으로 지어준 것이다.
 <선교장 열화당>/이진욱 기자
<선교장 열화당>/이진욱 기자심명숙 문화해설가는 “학식이 높고 귀한 손님들만 이 사랑채에 머물게 했다”면서 “지난 7월 열화당 건립 200주년을 기념해 대관령국제음악제 저명연주가 시리즈 ‘강원’이 이곳에서 열렸다”고 설명한다.
열화당 뒤편 초정(草亭)은 인상적이다. 열화당 후원의 정자로, 시문을 짓고 책을 읽던 곳이다. 또한 초가에 살고 있는 소작인들의 애환과 삶을 공감하고 검소와 베풂의 덕을 수련하도록 소박하게 지었다고 한다.
원추리 군락지가 조성돼 있어 ‘녹야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원추리의 야생력과 번식력이 선교장가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선교장 안채 부엌>/이진욱 기자
<선교장 안채 부엌>/이진욱 기자열화당 부속건물인 중사랑은 풍류객들과 교분을 나누던 곳이다. 23칸의 행랑채는 관동팔경과 금강산을 유람하는 시인, 묵객과 집안일을 하던 집사들의 거처로 사용되었다.
이밖에도 안팎으로 볼거리가 많다. 중요민속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있는 선교장에는 곳간채, 홍예헌, 자매재, 초가, 선교장 박물관 등이 있다. 1908년 곡식창고인 곳간채를 개조해 신학문을 가르치던 동진학교(東進學校)를 설립했으나 일제의 탄압에 의해 폐교됐다.
활래정의 단골손님이었던 몽양 여운형이 영어교사로 재직했다. 현재 선교장 생활유물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교장 매표소 인근의 선교장 박물관에는 300년 집안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추사 김정희도 만년에 이곳에 들러 ‘홍엽산거’(紅葉山居) 라는 작품을 남겼는데, 편액으로 만들어져 전시되고 있다.
선교장이 건축되기 전부터 자생한 노송 수백 그루가 우거져 있는 선교장 뒷동산 솔숲 길을 걸으면 솔향기와 전통가옥의 멋을 더욱 느낄 수 있다.


![[문화 탐방 한국민속촌3] 사진으로 보는 웅기생활관 [문화 탐방 한국민속촌3] 사진으로 보는 웅기생활관](https://peoplenews.kr/data/file/news/thumb-3718626401_4LNmTzQk_9b0413f7240f02ebdd7c100ae5d941e5913e5a1a_190x143.jpg)
![[문화 탐방 한국민속촌2] 사진으로 보는 세계 민속관 [문화 탐방 한국민속촌2] 사진으로 보는 세계 민속관](https://peoplenews.kr/data/file/news/thumb-2039008319_FLZCbHuM_d255c69c5e3d27f21a4e3f55207ca5d75dd5de79_190x143.jpg)
![[문화 탐방 한국민속촌1] 사진으로 보는 세계 민속관 [문화 탐방 한국민속촌1] 사진으로 보는 세계 민속관](https://peoplenews.kr/data/file/news/thumb-2039008319_FI8HVS9i_951a9882feced4766de4c56fe9d11bf74784cf17_190x143.jpg)